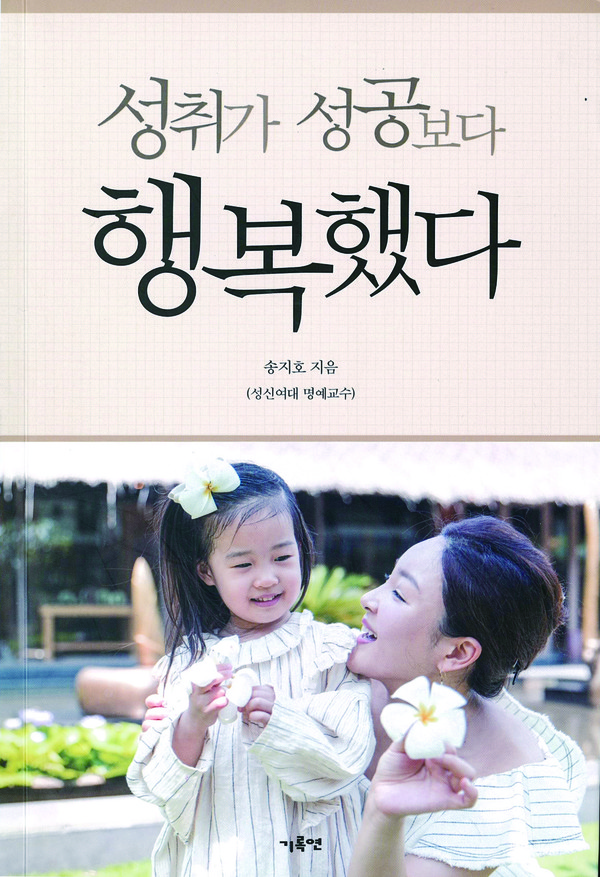
내가 평생 옳은 일에 꺾이지 않고 자존심만은 지키고 살았던 것은 이런 가문의 가르침 때문이었던 것 같다.
다섯 가족이 모여 사는 할머니 댁에서의 피난살이는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했고 매일 소란이 끊이지 않았다.
먹을 것이 풍족할 리도 없었다.
열 명이 넘는 손주들에게 먹일 간식이라고는 삶은 고구마, 감자가 전부였다.
가끔 어머니께서 검은콩을 볶아 할머니께 드리면 할머니는 손주들을 불러 일렬로 세우고 볶은 콩을 한 움큼씩 나눠주셨다.
콩을 손에 받아든 아이들은 어느새 게 눈 감추듯 먹어버리고는 세 살 난 어린 내 것을 뺏어먹곤 했다고 한다.
나도 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를 썼던 모양이다.
어머니에 의하면 할머니로부터 고사리 같은 손에 받아든 콩을 치마폭에 숨기고 곱돌로 방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더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동그라미 안에 콩을 가지런히 채워 놓고는 누가 뺏어가지 못하게 내가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누가 몰래 콩알을 몇 개 살짝 건드리면 곧바로 표시가 났기에 바로 알아차리고 누가 콩을 가져갔냐며 콩을 발로 차버리고 울어버리는 통에 그 후로는 아무도 감히 내 콩을 뺏어 먹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 살짜리가 낸 꾀를 아무도 이겨내지 못한 셈이다.
할머니 집에서 지낸 3년여 동안 나는 고종사촌들에게 치이며 살았다.
그렇게 사는 동안 나름대로 힘이 센 사람의 서열도 잘 알고 있었다.
나이는 어렸지만 눈치로 처세를 터득한 것이다.
제일은 할머니이셨지만 다음은 고모들이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음을 뜻했다.
혹여라도 내가 고종사촌들 즉 고모 딸을 한 대라도 때리면 바로 고모가 등판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가 사촌 동생에게 맞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나는 견딜 수 밖에 없었고 참는 것이 편했다.
내가 같이 대들면 그 대가로 어머니가 그만큼 더 힘든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종사촌 동생이 내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가 나서 방으로 울며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의 속상해하시던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남자도 아니고 계집애 얼굴에 손톱자국이라니….”
그때 어머니는 쓰라림과 분노를 참아내고 있었고 나는 어머니의 아픈 표정을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었다.
아마도 그런 일들이 어머니의 결심을 끌어냈을 것이다.
더는 인내하고만 살 수 없다고 판단하신 끝에 할머니께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셨다.
“애들 교육만은 시골이 아닌 도시에 나가 가르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대전으로 가서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짐을 싸셨다.
어머니는 명석한 4남매 교육을 위해서는 할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도 우리를 시골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자식들 교육만은 무슨 희생을 해서라도 도시에서 시키겠다는 결정이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남다른 교육열이기도 했다.
나중에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그냥 시골에서 그대로 살고 만다면 내 자식들은 남의 집 머슴이나 식모가 되겠구나 싶어서 힘든 결심할 수 밖에 없었다.”
어쩌면, 그때 어머니의 무모한 폭탄선언이 없었다면 우리 4남매는 정말 남의 집 머슴이나 식모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거나 어머니의 기상천외한 결심으로 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와 우리 4남매의 눈칫밥 생활도 끝이 났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고 우리 앞에는 더 험난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혼자 가정을 꾸려본 적 없는 겨우 30대 중반의 어머니가 도시에서 자식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버거운 일이었다.
짧지만 행복했던 외가의 추억
옥천 할머니 집을 나오면서 우리 가족은 세 갈래로 갈라져야 했다.
언니는 계속 할머니 집에서 살기로 했다.
눈치 빠른 언니는 할머니 심부름을 도맡아 하면서 귀여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빠는 서울로 떠났고 어머니는 나와 동생 손을 잡고 일단 외갓집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외가로 가셨던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외할머니 집에 있던 일제 ‘싱거(singer) 재봉틀’이 우선 필요했고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외가에 맡겨놓기 위해서였다.
당시 ‘싱거 재봉틀’은 귀한 물건이었고 외가에서도 큰 자산이었다.
그런 물건을 달라고 어머니는 외할머니께 염치없는 부탁을 드렸다.
그러고는 나를 남겨놓고 재봉틀을 머리에 이고 한 손으로는 동생 손을 잡고 삽작문을 나섰다.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올게.”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와 헤어지는 순간이었기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나는 어머니의 그런 결정이 어쩔 수 없음을 어린 마음속으로도 깨닫고 있었다.
다행히 나에게 외가는 편안했다.
늘 엄하고 무섭기만 했던 할머니와는 달리 외할머니는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었고 나에게 야단만 치고 딸만 챙기던 고모들과는 달리 막내 이모는 나를 무척 예뻐해 주었다.
또 어디를 가든 내 손을 잡고 데리고 다녔다.
내가 외가에서 살았던 기간은 어머니가 대전에서 자리를 잡고 나를 데려가기 전까지 2년 정도다.
하지만 여섯 살에 시작한 외갓집 생활은 내게 그 어떤 시절보다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된다.
매일 눈만 뜨면 고모의 눈치를 봐야 했고, 항상 고종사촌들에 치여 천덕꾸러기처럼 지내야 했던 할머니 집과 비교가 되었다.
외가에서는 예쁨과 관심을 독차지했고 새로 만난 친구들과 어깨동무하고 동네 여기저기 노래를 부르며 마음껏 뛰어다녀도 누구도 뭐라 야단치지 않았다.


